연세숲정신건강의학과 하주원 원장 인터뷰


하주원 원장은 스스로의 성격 때문에 예민한 환자들에게 쉽게 공감하고 적극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그의 진료철학은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종종 하는 "쉬면 낫습니다"라는 말은 하주원 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다. "우리 삶이라는 게 마음먹는 대로 쉴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막상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 환자들에겐 절대로 하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는 게 환자 입장에서 훨씬 좋죠"
하주원 원장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끊는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 "일과 관계없는 것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저는 생각을 비우기 위해 킥복싱 같은 운동이나 게임을 주로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정적인 운동은 잡념을 해소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는 책 읽는 것도 매우 좋아하지만, 심리 서적은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닌 공부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신간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을 쓴 계기는 무엇일까? "모든 책은 제가 읽으려고 써요. 너무 불안이 많고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담는다는 생각으로 쓰는 거죠. 개인적으로 불안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병원에도 불안장애 환자가 가장 많아요" 그는 이어 "쿨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한다는 건 이상한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불안이 많고 예민한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하주원 원장은 '불안'할 때 그 원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 불안의 원인이 해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되고 원인을 모른다고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불안장애를 앓기 쉬운 성격도 있다. 예민하고 남의 눈을 많이 신경 쓰고, 이미 일어난 일을 곱씹는 성격일 때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에 대해 비난받기도 쉽다. '왜 이렇게 소심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라는 식이다. 그러면 불안은 더 커진다.
하주원 원장은 "눈치 보고 살아도 된다"고 말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말은 정말 눈치 안 보고 살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눈치 보는 너 자신이 문제라는 뜻과 같죠. 하지만 불안하고 소심하게 평생 살아온 사람은 갑자기 당당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자기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못 말하기도 하고, 오히려 화를 많이 내게 될 수 있어요. 안 하던 성격을 따라 하려니 긴장되니까요. 눈치를 너무 안 보는 '자폐증'은 병이에요. 눈치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좋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남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저는 눈치 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뭘 그런 것 가지고 불안해하냐'라고 묻는 말도 사실 옳지 않다. 불안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의 불안이 심하다. 자신에게 불안하지 않는 무언가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충분히 불안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하 원장의 설명이다.
자존감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존감이 낮아서 정신과에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존감은 결과에요. 자존감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만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죠.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한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등 실제적인 행동을 쌓아가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제가 책을 쓴 저자의 입장이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고 생각만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요. 행동하고 그로 인한 보상을 받고 나서 책을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더불어 불안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더 나은 불안을 향해 낡은 불안을 벗고 새로운 불안을 입는 과정을 행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게 하 원장의 말이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매 맞고 사는 아내는 이로 인해 불안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끝맺지 못한다. 새로운 세계로의 자립 역시 불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불안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저도 개원할 때 불안했어요, 왜 대학병원에 있지 나왔냐는 얘기도 들었죠. 하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불안이 완전히 끝나는 평화를 맛보는 것이 아녜요. 조금 더 나은 불안을 입는 과정으로 개선시키는 데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선택이든 조금 더 쉽게 해낼 수 있어요"
갑자기 심각한 불안감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긴장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되뇌는 건 좋지 않다. 하주원 원장은 "자율신경은 청개구리 같아서 누르면 더 튀어 오른다"며 "불안하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불안할 수 있어'라며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숨을 내뱉어야 한다. 불안이 심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릴 수 있다. 이때는 뇌가 일종의 과호흡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으로 뭔가 가져가게 된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단 음식이 당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대한 반대로 숨을 내뱉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도 불안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평소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 과거 우울증 치료약이 없을 때는 사람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기계도 있었다. 계속 누워있으면 누구라도 과거부터 먼 미래까지의 걱정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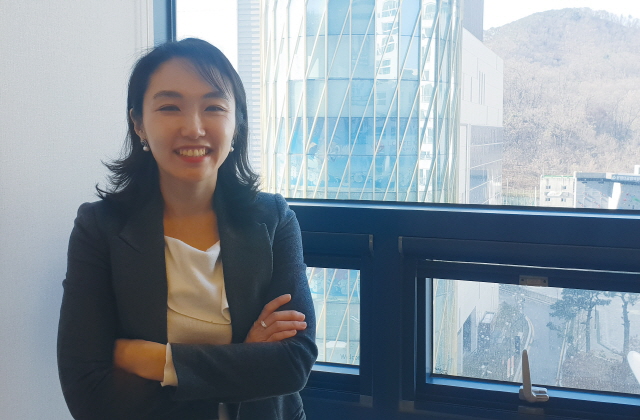
항상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부탁했더니, 하주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불안도 팔자다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불안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룬 것도 많으실 거예요. 불안했기 때문에 예민하고, 남 배려를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요. 불안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 곁에 없었을 게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불안이 비정상적인 감정은 아니거든요. 너무 불안한 시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억누르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신과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한 마디 부탁했다.
"정신과 방문이 도저히 어렵다면, 일단 가서 대기석에 앉아만 있어 보세요. 어떤 환자들이 오는 곳인지 분위기만 봐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찾는 곳이에요. 자기 문제를 깨닫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 거죠. 자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정신적 문제가 심한 순서대로 정신과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병원보다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더 많이 봐요. 자기 문제를 알고 고치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신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