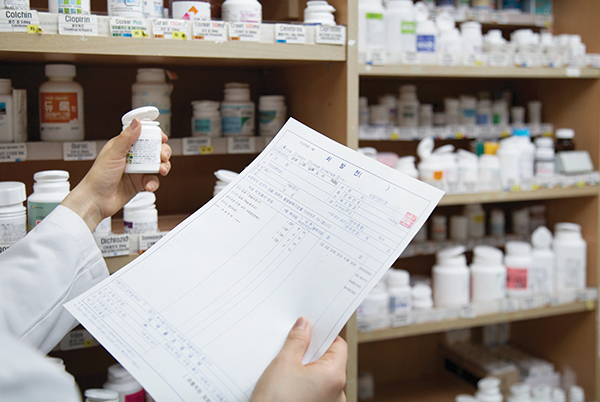
항생제는 미생물·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로 만든 약이다. 감기·알레르기성 비염·피부염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쓰여 익숙한 약인데, 최근 항생제 내성균(耐性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은 말 그대로 특정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세균이다.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면, 그만큼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 질병 치료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70여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돼 사망한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2050년에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1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항생제 내성은 병원의 무분별한 처방도 원인이지만, 환자의 잘못된 복용법도 문제가 된다. 처방받은 항생제를 끝까지 다 복용하지 않거나, 3개월 내 같은 성분의 항생제를 또 복용하면 내성균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결국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고, 일단 복용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다.
처방받은 항생제를 먹다 증상이 낫는 것 같아 복용을 중단하면, 몸속 세균이 완전히 죽지 않고 늠는다. 남은 세균은 더는 항생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포막을 강하게 만드는 등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내성균으로 변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세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용량·기간의 항생제를 처방한다.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증상이 나았다고 해도 세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먹어야 한다.
한편,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같은 항생제를 3개월 내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지 않고 있고, 캐나다약사회도 환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 항생제를 먹은 적 있는지 필수로 묻는다. 3개월 내에 같은 성분 항생제를 또 복용하면 내성균이 생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에게 직접 항생제 복용력을 알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같은 항생제를 재사용해도 내성 위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도 과거에 걸렸던 질병과 먹었던 항생제, 약효가 잘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의사에게 알리면 더 효과적인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사람마다 몸에 잘 안 듣는 항생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효과가 없는 항생제를 미리 알아두고 병원을 옮길 때 항생제 처방전을 챙겨가는 게 좋다. 항생제 복용 후 48~72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낫지 않으면,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을 수 있다. 이때는 다른 성분의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균 배양검사로 내성균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