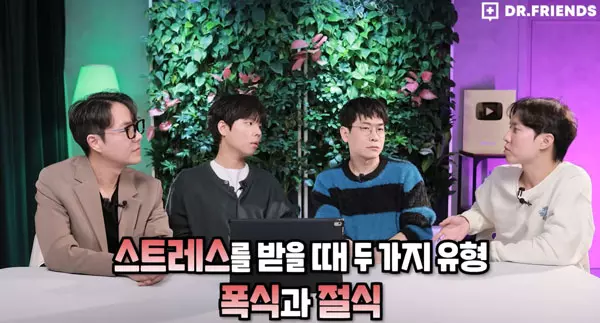
가수 정승환(29)과 의학 유튜버 닥터프렌즈가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폭식과 절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25일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에는 ‘싸이버거 5개를 먹어도 생각난다면 그건 사랑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가수 정승환은 닥터프렌즈 이낙준(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진승(정신과 전문의), 우창윤(내과 전문의)과 사랑과 이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이별과 관련된 구독자 사연을 읽던 중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햄최몇(햄버거 최대 몇 )도전합니다. 가장 많이 먹은 건 싸이버거 세트 5개입니다 ’라는 댓글과 ‘이별한 김에 곡기를 끊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댓글을 발견하고 이별 상황에서 폭식을 하는 유형과 절식을 하는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정승환은 전자에 대해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사실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 유형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윤은 "저렇게 배부르면 약간 감정이 무뎌지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식욕을 떨어뜨린다”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진료 부교수는 두 유형의 차이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과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감정이 무뎌지는 것을 경험해 그게 조건화된 사람은 폭식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휴식과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억제돼 일시적으로 식욕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위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어 이미 섭취한 음식도 소화가 어렵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화되면 폭식할 위험이 크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과다해지고, 코르티솔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약화해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우울, 불안, 공허함,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보상 심리로 식욕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때 열량이 높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경우가 많아 욕구를 참지 못하면 영양소 과잉 섭취나 체중 증가,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폭식을 끊어내지 못할 경우 짧은 시간에 통제력을 잃고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는 섭식 장애의 일종인 ‘폭식증’이나 음식을 먹는 것에 중독되는 ‘음식 중독’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식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고통러운 감정을 일시적으로 둔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스트레스성 폭식을 예방하는 데는 ▲운동 ▲명상 ▲음악 감상 ▲취미 활동 ▲규칙적인 생활 ▲감정 일기 ▲사회적 교류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된다. 특히, 감정 일기는 현재 상황과 스트레스 원인, 해결 방법 등을 당사자가 직접 고민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식 증상이 심할 경우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심리 치료에는 ▲인지 행동 치료 ▲대인관계 치료 ▲변증법적 행동 치료 등이, 약물 치료에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 ▲플루옥세틴 등이 활용된다.
지난 25일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에는 ‘싸이버거 5개를 먹어도 생각난다면 그건 사랑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가수 정승환은 닥터프렌즈 이낙준(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진승(정신과 전문의), 우창윤(내과 전문의)과 사랑과 이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이별과 관련된 구독자 사연을 읽던 중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햄최몇(햄버거 최대 몇 )도전합니다. 가장 많이 먹은 건 싸이버거 세트 5개입니다 ’라는 댓글과 ‘이별한 김에 곡기를 끊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댓글을 발견하고 이별 상황에서 폭식을 하는 유형과 절식을 하는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정승환은 전자에 대해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사실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 유형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윤은 "저렇게 배부르면 약간 감정이 무뎌지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식욕을 떨어뜨린다”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진료 부교수는 두 유형의 차이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과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감정이 무뎌지는 것을 경험해 그게 조건화된 사람은 폭식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휴식과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억제돼 일시적으로 식욕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위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어 이미 섭취한 음식도 소화가 어렵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화되면 폭식할 위험이 크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과다해지고, 코르티솔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약화해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우울, 불안, 공허함,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보상 심리로 식욕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때 열량이 높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경우가 많아 욕구를 참지 못하면 영양소 과잉 섭취나 체중 증가,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폭식을 끊어내지 못할 경우 짧은 시간에 통제력을 잃고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는 섭식 장애의 일종인 ‘폭식증’이나 음식을 먹는 것에 중독되는 ‘음식 중독’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식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고통러운 감정을 일시적으로 둔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스트레스성 폭식을 예방하는 데는 ▲운동 ▲명상 ▲음악 감상 ▲취미 활동 ▲규칙적인 생활 ▲감정 일기 ▲사회적 교류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된다. 특히, 감정 일기는 현재 상황과 스트레스 원인, 해결 방법 등을 당사자가 직접 고민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식 증상이 심할 경우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심리 치료에는 ▲인지 행동 치료 ▲대인관계 치료 ▲변증법적 행동 치료 등이, 약물 치료에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 ▲플루옥세틴 등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