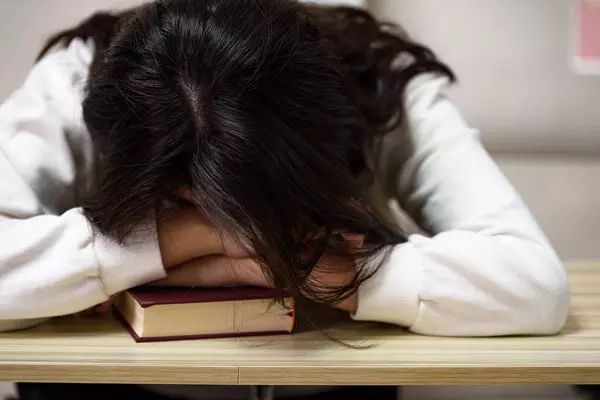
학생들의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비단 자살뿐 아니라 자해도 문제다. 네이버 블로그 ‘윤노랑쌤’s 마음공간’을 운영하는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담임 교사들이 ‘반 아이 중에 자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며 “실제로 자해 문제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에게 상담 의뢰가 들어오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해 학생이 모두 자살을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10%는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게다가 자해 자체가 심리적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학생들의 자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자해 학생 조용히 증가 추세
자해 학생이 느는 현상은 통계에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해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13%, 2020년 대비 1066%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현황 통계상으로는 2023년 한 해 동안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10대 이하 청소년이 6395명이었다. 2년 전인 2021년(5486명)보다 909명, 14.2%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학생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커터칼로 피부를 긋는 등의 자해 행위가 남긴 상처를 숨기려고 한다. 상처가 남은 곳에 시계를 차거나, 파스를 붙이거나, 이마저도 부족하면 긴 팔을 입고 다니는 식이다. 당연히 ‘자해를 멈추고 싶다’며 스스로 교내 위클래스(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을 시행하는 교내 상담 공간)나 외부 상담 센터를 찾아가는 일도 드물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자해 상처를 가릴 반창고를 받으러 보건실에 갔다가 보건교사가 알아채거나, 담임교사가 인지해 상담으로 연계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극도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 관심 끌 목적 아냐
전문가들은 극도의 정서적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는 “정신적 고통을 신체적 고통으로 바꾸면 뇌에서 진통 물질인 엔돌핀이 분비돼 일시적으로 마음이 진정된다”며 “극심한 자기혐오 탓에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행할 때도 있고, 삶이 공허하다고 느낄 때 통증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받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살·자해 예방 전문 상담센터 굿씨상담센터 박지란 대표는 “내면의 어려움을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이해받지 못했으면서 별다른 해소 창구가 없을 때에 자해 행위로 이어지고는 한다”고 말했다.
자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은 결코 쉬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무척 매운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본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로 침체되어 있을 때, 몸에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부정적인 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끌고 싶어서’ 자해를 한다는 생각은 오해다. 자해한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좋아요’가 아니라 도움을 갈구하는 신호로 봐야 한다. 사공정규 교수는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해하는 경우라면 이를 온라인으로 타인, 특히 또래와 공유하며 공감을 주고받으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해 대신 다른 행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유도
몸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인 만큼, 학생의 자해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사람은 학생을 야단친다. “안 좋은 행위다”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해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은 학생들도 잘 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다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니 궁여지책으로 자해를 택할 뿐이다. 무작정 말리기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 이유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자해 학생을 상담할 때에는 ‘네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으면 그랬겠니’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며 “오히려 ‘자해하지 마’ ‘자해를 얼마나 하니?’ ‘언제부터 했니?’ 같은 말로 운을 떼면 학생들이 거부감을 보인다”고 말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자해 학생을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길 권한다. 첫째로,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차분히 대하는 것이다. 주변인의 눈에 띄는 것은 몸에 남은 상처지만, 그 상처를 만든 자해 행위는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일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둘째로, 자해 학생이 털어놓은 어려움을 ‘네 생각만큼 힘든 일은 아니다’라고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경청한다. 그리고 이따금씩 ‘많이 힘들었겠구나’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넨다. 셋째로, 자해하지 말라고 윽박지르지 않는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또다시 맞닥뜨렸을 때 자해 대신 시도해볼 만한 행동을 연결해주는 것이 좋다. 몸에 상처를 내는 대신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몸에 대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 식으로 강한 감각적 자극을 주는 것이 한 예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고무줄을 손목에 끼고 다니면서 자해 충동이 들 때마다 피부에 상처를 내는 대신 고무줄을 튕겨 따끔한 자극만 주기로 학생과 약속하기도 한다”며 “자해 대신 몸에 가하는 감각 자극의 강도를 점차 약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것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바깥으로 분출할 수 있는 건강한 수단을 찾아주는 것이다. 사공정규 교수는 “학생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니 ‘자해가 잠깐은 감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힘들면 나를 먼저 찾아줘’라는 말을 해 주고 심리적 지지를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비자살적 자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과 감정·충동을 조절하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친구와의 수다, 러닝, 헬스,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감정 일기 쓰기, 좋아하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 시청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마음 보호하고 외부 상담·진료 연계해야
학교 차원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박지란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대인 관계 어려움이 자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상담해보니 어울릴 친구가 없이 혼자가 되는 것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이것이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둠 수업 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하기보다는 교사가 모둠을 만들어줄 것을 권장했다. 친구를 사귀는 데에 실패한 아이들의 경우 어느 모둠에도 쉽게 끼지 못해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준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따돌림에 자기 혐오가 극심해져, ‘나는 나쁜 아이니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강박적으로 헌혈하는 자해 사례도 있었다.
물론, 대인 관계가 자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므로 학생의 정서 건강 전반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언어를 이용해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며 “한두 번의 교내 상담으로는 어려운 일이므로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상담 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청소년이라면 ‘다 들어줄 개’ 서비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텍스트 기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다. ‘다 들어줄 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 들어줄 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전문 상담사나 교사가 상담을 시행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시작 화면에서 ‘유관 기관 찾기’를 클릭하면 전국 위센터, 가족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병원, 보건소, 청소년 쉼터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기관의 전화번호를 모아볼 수 있다.
자해 학생이 모두 자살을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10%는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게다가 자해 자체가 심리적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학생들의 자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자해 학생 조용히 증가 추세
자해 학생이 느는 현상은 통계에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해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13%, 2020년 대비 1066%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현황 통계상으로는 2023년 한 해 동안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10대 이하 청소년이 6395명이었다. 2년 전인 2021년(5486명)보다 909명, 14.2%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학생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커터칼로 피부를 긋는 등의 자해 행위가 남긴 상처를 숨기려고 한다. 상처가 남은 곳에 시계를 차거나, 파스를 붙이거나, 이마저도 부족하면 긴 팔을 입고 다니는 식이다. 당연히 ‘자해를 멈추고 싶다’며 스스로 교내 위클래스(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을 시행하는 교내 상담 공간)나 외부 상담 센터를 찾아가는 일도 드물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자해 상처를 가릴 반창고를 받으러 보건실에 갔다가 보건교사가 알아채거나, 담임교사가 인지해 상담으로 연계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극도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 관심 끌 목적 아냐
전문가들은 극도의 정서적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는 “정신적 고통을 신체적 고통으로 바꾸면 뇌에서 진통 물질인 엔돌핀이 분비돼 일시적으로 마음이 진정된다”며 “극심한 자기혐오 탓에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행할 때도 있고, 삶이 공허하다고 느낄 때 통증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받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살·자해 예방 전문 상담센터 굿씨상담센터 박지란 대표는 “내면의 어려움을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이해받지 못했으면서 별다른 해소 창구가 없을 때에 자해 행위로 이어지고는 한다”고 말했다.
자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은 결코 쉬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무척 매운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본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로 침체되어 있을 때, 몸에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부정적인 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끌고 싶어서’ 자해를 한다는 생각은 오해다. 자해한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좋아요’가 아니라 도움을 갈구하는 신호로 봐야 한다. 사공정규 교수는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해하는 경우라면 이를 온라인으로 타인, 특히 또래와 공유하며 공감을 주고받으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해 대신 다른 행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유도
몸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인 만큼, 학생의 자해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사람은 학생을 야단친다. “안 좋은 행위다”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해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은 학생들도 잘 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다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니 궁여지책으로 자해를 택할 뿐이다. 무작정 말리기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 이유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자해 학생을 상담할 때에는 ‘네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으면 그랬겠니’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며 “오히려 ‘자해하지 마’ ‘자해를 얼마나 하니?’ ‘언제부터 했니?’ 같은 말로 운을 떼면 학생들이 거부감을 보인다”고 말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자해 학생을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길 권한다. 첫째로,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차분히 대하는 것이다. 주변인의 눈에 띄는 것은 몸에 남은 상처지만, 그 상처를 만든 자해 행위는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일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둘째로, 자해 학생이 털어놓은 어려움을 ‘네 생각만큼 힘든 일은 아니다’라고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경청한다. 그리고 이따금씩 ‘많이 힘들었겠구나’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넨다. 셋째로, 자해하지 말라고 윽박지르지 않는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또다시 맞닥뜨렸을 때 자해 대신 시도해볼 만한 행동을 연결해주는 것이 좋다. 몸에 상처를 내는 대신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몸에 대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 식으로 강한 감각적 자극을 주는 것이 한 예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고무줄을 손목에 끼고 다니면서 자해 충동이 들 때마다 피부에 상처를 내는 대신 고무줄을 튕겨 따끔한 자극만 주기로 학생과 약속하기도 한다”며 “자해 대신 몸에 가하는 감각 자극의 강도를 점차 약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것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바깥으로 분출할 수 있는 건강한 수단을 찾아주는 것이다. 사공정규 교수는 “학생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니 ‘자해가 잠깐은 감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힘들면 나를 먼저 찾아줘’라는 말을 해 주고 심리적 지지를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비자살적 자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과 감정·충동을 조절하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친구와의 수다, 러닝, 헬스,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감정 일기 쓰기, 좋아하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 시청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마음 보호하고 외부 상담·진료 연계해야
학교 차원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박지란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대인 관계 어려움이 자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상담해보니 어울릴 친구가 없이 혼자가 되는 것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이것이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둠 수업 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하기보다는 교사가 모둠을 만들어줄 것을 권장했다. 친구를 사귀는 데에 실패한 아이들의 경우 어느 모둠에도 쉽게 끼지 못해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준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따돌림에 자기 혐오가 극심해져, ‘나는 나쁜 아이니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강박적으로 헌혈하는 자해 사례도 있었다.
물론, 대인 관계가 자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므로 학생의 정서 건강 전반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윤수빈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언어를 이용해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며 “한두 번의 교내 상담으로는 어려운 일이므로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상담 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청소년이라면 ‘다 들어줄 개’ 서비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텍스트 기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다. ‘다 들어줄 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 들어줄 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전문 상담사나 교사가 상담을 시행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시작 화면에서 ‘유관 기관 찾기’를 클릭하면 전국 위센터, 가족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병원, 보건소, 청소년 쉼터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기관의 전화번호를 모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