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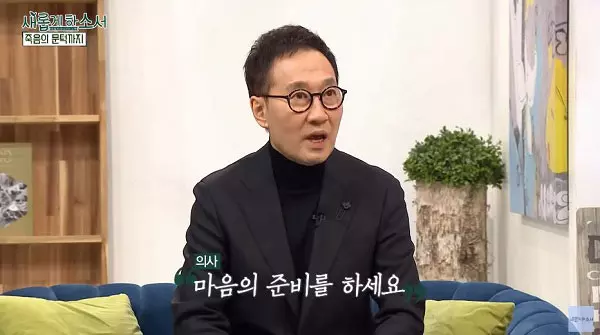
폐섬유증 진단 후 합병증으로 사실상 사망 진단을 받았던 가수 유열(64)이 건강을 회복한 근황을 전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CBS’에는 유열이 출연해 폐섬유증 투병기를 공유했다. 유열은 2023년 폐섬유증 투병 사실을 알렸으며, 2018년 진단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9년 전 종합건강검진을 했는데 X-ray 검사에서 폐에 상처가 보여서 추적관찰을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체온이 40도까지 올라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했는데 급성 폐렴이었다”며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해서 진행했더니 폐섬유증이었다”고 말했다.
유열은 진단 당시를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잘 관리하면 됐었다”며 “그러다가 작년 5월에 독감에 걸렸다”고 말했다. 3~4일 만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자,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이 발견됐다. 유열은 “폐섬유증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 시술을 했는데도 상태가 계속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가 아내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연명 치료를 하실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사실상 사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행히 유열은 작년 건강한 폐를 기증받았으며, 건강을 회복해 작년 10월 31일 퇴원했다.
유열이 겪은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폐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질환이다. 폐섬유증은 대부분 명확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다. 평균 생존율이 진단 후 3~4년 정도로 알려진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장기간 호전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폐섬유증 초기에는 마른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 일반 감기로 오해하기 쉽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폐가 손상되지만,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발견이 어려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약물이나 산소치료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한번 섬유화된 폐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해, 유열처럼 폐이식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시행된 167건의 폐이식 중 절반에 가까운 74건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였다.
15일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CBS’에는 유열이 출연해 폐섬유증 투병기를 공유했다. 유열은 2023년 폐섬유증 투병 사실을 알렸으며, 2018년 진단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9년 전 종합건강검진을 했는데 X-ray 검사에서 폐에 상처가 보여서 추적관찰을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체온이 40도까지 올라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했는데 급성 폐렴이었다”며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해서 진행했더니 폐섬유증이었다”고 말했다.
유열은 진단 당시를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잘 관리하면 됐었다”며 “그러다가 작년 5월에 독감에 걸렸다”고 말했다. 3~4일 만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자,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이 발견됐다. 유열은 “폐섬유증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 시술을 했는데도 상태가 계속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가 아내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연명 치료를 하실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사실상 사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행히 유열은 작년 건강한 폐를 기증받았으며, 건강을 회복해 작년 10월 31일 퇴원했다.
유열이 겪은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폐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질환이다. 폐섬유증은 대부분 명확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다. 평균 생존율이 진단 후 3~4년 정도로 알려진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장기간 호전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폐섬유증 초기에는 마른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 일반 감기로 오해하기 쉽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폐가 손상되지만,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발견이 어려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약물이나 산소치료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한번 섬유화된 폐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해, 유열처럼 폐이식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시행된 167건의 폐이식 중 절반에 가까운 74건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