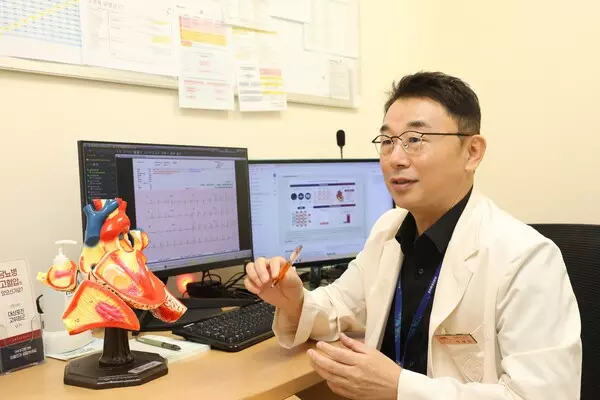
수축 기능이 보존된 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알아채기 까다롭다. 최근 국내 연구팀이 AI로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박출률 보존 심부전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기능적 이상으로 심장이 제대로 이완·수축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그중 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좌심실 박출츌은 정상(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장 이완 기능이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병이다. 국내외 심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단순 증상과 박출률 검사로는 구분이 불가능해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경민·홍다위 교수 연구팀이 AI를 활용해 박출률 보존 심부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복잡한 검사 없이 병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12유도 심전도 검사 결과 값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AI 모델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2016~2022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심초음파, NT-proBNP, 12유도 심전도 검사를 모두 시행한 1만 3081명을 대상으로 유럽심장학회 기준(HFA-PEFF)을 참고해 환자 위험도에 따라 박출량 보전 심부전 그룹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학습시켜 미세한 전기 신호 패턴까지 포착하도록 AI 모델을 설계했다. AI가 실제 임상 현실에 가까운 조건에서도 정확한 예측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 환자별 임상·영상·혈액 데이터에 검증과 테스트 데이터도 포함시켰다. 데이터셋은 학습-검증-테스트를 각각 7:1:2로 분할해 구성했다. 최대 5년(중간값 4년) 동안 모은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AI 심전도 예측 모델의 성능(AUC) 81%에 달했다. 특히 고령,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주요 위험군에서도 78~83%로 모델 성능이 유지됐다.
AI가 ‘양성’으로 예측한 환자의 5년 내 심장사망 위험은 음성군 대비 열 배,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은 다섯 배 높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AI 기반 심전도 모델을 활용해 박출량 보존 심부전 가능성을 예측한 국내 첫 연구”라며 “세계적으로 이완기 기능 저하나 좌심실 충만압 상승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HFA-PEFF 점수를 기준으로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박경민 교수는 “기존 심장초음파나 혈액검사가 없는 환자에서도 간단한 심전도 검사만으로 박출량 보존 심부전의 가능성을 조기에 의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며 “향후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검증을 추가하는 연구도 지속할 예정” 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 디지털헬스 관련 학술지(European Heart Journal - Digital Health) 최근호에 발표됐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기능적 이상으로 심장이 제대로 이완·수축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그중 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좌심실 박출츌은 정상(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장 이완 기능이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병이다. 국내외 심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단순 증상과 박출률 검사로는 구분이 불가능해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경민·홍다위 교수 연구팀이 AI를 활용해 박출률 보존 심부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복잡한 검사 없이 병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12유도 심전도 검사 결과 값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AI 모델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2016~2022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심초음파, NT-proBNP, 12유도 심전도 검사를 모두 시행한 1만 3081명을 대상으로 유럽심장학회 기준(HFA-PEFF)을 참고해 환자 위험도에 따라 박출량 보전 심부전 그룹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학습시켜 미세한 전기 신호 패턴까지 포착하도록 AI 모델을 설계했다. AI가 실제 임상 현실에 가까운 조건에서도 정확한 예측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 환자별 임상·영상·혈액 데이터에 검증과 테스트 데이터도 포함시켰다. 데이터셋은 학습-검증-테스트를 각각 7:1:2로 분할해 구성했다. 최대 5년(중간값 4년) 동안 모은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AI 심전도 예측 모델의 성능(AUC) 81%에 달했다. 특히 고령,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주요 위험군에서도 78~83%로 모델 성능이 유지됐다.
AI가 ‘양성’으로 예측한 환자의 5년 내 심장사망 위험은 음성군 대비 열 배,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은 다섯 배 높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AI 기반 심전도 모델을 활용해 박출량 보존 심부전 가능성을 예측한 국내 첫 연구”라며 “세계적으로 이완기 기능 저하나 좌심실 충만압 상승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HFA-PEFF 점수를 기준으로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박경민 교수는 “기존 심장초음파나 혈액검사가 없는 환자에서도 간단한 심전도 검사만으로 박출량 보존 심부전의 가능성을 조기에 의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며 “향후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검증을 추가하는 연구도 지속할 예정” 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 디지털헬스 관련 학술지(European Heart Journal - Digital Health) 최근호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