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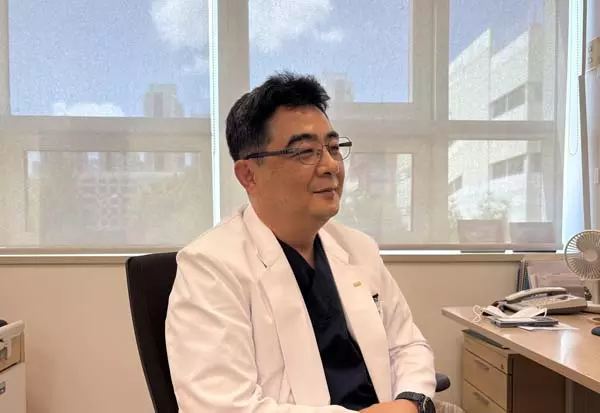
정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낮은 이용률과 인력·재정 부담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종양내과 김찬규 교수는 “보여주기식 공간 설치를 넘어서려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임종실 사용 사례자, “의료진 관심에 감사”
지난달, 순천향대 부천병원 암병동에는 70대 여성 환자 A씨가 입원했다. 말기 폐암으로 항암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찬규 교수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임종실 사용을 권유했고, 가족은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기로 했다. A씨는 임종실에서 4일을 머무는 동안 섬세한 통증 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 가족들은 의료진에 “다인실에서 다른 환자들 눈치를 보며 마지막을 맞이할까 두려웠는데, 임종실에서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가족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뒀다.
김 교수는 “임종실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1인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병원 내 임종실이 생긴 후 이곳에서 마지막을 보낸 환자의 보호자들이 끝까지 의료진의 관심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고맙다며 인사를 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생겼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임종실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위법이다.
◇환자에게 임종실 권유하기 어려운 현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A씨처럼 임종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는 많지 않다. 의료진 입장에서 임종실 사용을 권유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임종기 판단부터 어렵다. 임종실을 이용하려면 두 명 이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임종기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현장에서 임종 과정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 김 교수는 “호흡이 불안정해지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 임종기라 판단하는 기준이 있긴 하다”며 “그러나 같은 질환이어도 임종까지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임종실 권유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간이 3일인 점도 걸림돌이다. 실제 임종 과정은 그보다 더 길 수 있다. 문제는 입원료 산정 기간을 설명하는 과정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보호자들은 대부분 같이 있기를 원하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아까워하지는 않는다”며 “그런데 입원료 산정 기간이 3일이라고 설명하면 ‘3일 안에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는 보호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래 봐서 신뢰감이 쌓인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임종실을 권유하는 실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확충부터”
실제 임종실 이용률은 매우 낮다. 보건복지부가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임종실을 설치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용 실적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대목동병원과 고려대구로병원, 중앙대병원이 각 한 명, 고려대안암병원이 두 명, 세브란스 병원이 세 명이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한 달에 2~3명이 임종실을 이용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은 이용률이 더 낮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려면 의사나 간호사 외에 자원봉사자나 종교계 인사도 필요하다”며 “규모가 큰 병원들은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있지만 300병상 규모의 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간만 만든 다음 실제로는 활용하지 않는 병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가 존엄한 죽음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려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함께 확충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존엄한 죽음은 3일 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길게는 수개월 동안 환자와 가족이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처럼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기 전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늘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호스피스 병상 수는 1500여개다. 말기암 환자들이 사망 전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김 교수는 “임종실 설치 의무화가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수도권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기관을 확충하고, 병원 간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실 사용 사례자, “의료진 관심에 감사”
지난달, 순천향대 부천병원 암병동에는 70대 여성 환자 A씨가 입원했다. 말기 폐암으로 항암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찬규 교수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임종실 사용을 권유했고, 가족은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기로 했다. A씨는 임종실에서 4일을 머무는 동안 섬세한 통증 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 가족들은 의료진에 “다인실에서 다른 환자들 눈치를 보며 마지막을 맞이할까 두려웠는데, 임종실에서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가족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뒀다.
김 교수는 “임종실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1인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병원 내 임종실이 생긴 후 이곳에서 마지막을 보낸 환자의 보호자들이 끝까지 의료진의 관심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고맙다며 인사를 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생겼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임종실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위법이다.
◇환자에게 임종실 권유하기 어려운 현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A씨처럼 임종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는 많지 않다. 의료진 입장에서 임종실 사용을 권유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임종기 판단부터 어렵다. 임종실을 이용하려면 두 명 이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임종기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현장에서 임종 과정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 김 교수는 “호흡이 불안정해지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 임종기라 판단하는 기준이 있긴 하다”며 “그러나 같은 질환이어도 임종까지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임종실 권유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간이 3일인 점도 걸림돌이다. 실제 임종 과정은 그보다 더 길 수 있다. 문제는 입원료 산정 기간을 설명하는 과정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보호자들은 대부분 같이 있기를 원하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아까워하지는 않는다”며 “그런데 입원료 산정 기간이 3일이라고 설명하면 ‘3일 안에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는 보호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래 봐서 신뢰감이 쌓인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임종실을 권유하는 실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확충부터”
실제 임종실 이용률은 매우 낮다. 보건복지부가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임종실을 설치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용 실적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대목동병원과 고려대구로병원, 중앙대병원이 각 한 명, 고려대안암병원이 두 명, 세브란스 병원이 세 명이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한 달에 2~3명이 임종실을 이용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은 이용률이 더 낮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려면 의사나 간호사 외에 자원봉사자나 종교계 인사도 필요하다”며 “규모가 큰 병원들은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있지만 300병상 규모의 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간만 만든 다음 실제로는 활용하지 않는 병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가 존엄한 죽음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려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함께 확충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존엄한 죽음은 3일 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길게는 수개월 동안 환자와 가족이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처럼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기 전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늘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호스피스 병상 수는 1500여개다. 말기암 환자들이 사망 전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김 교수는 “임종실 설치 의무화가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수도권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기관을 확충하고, 병원 간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