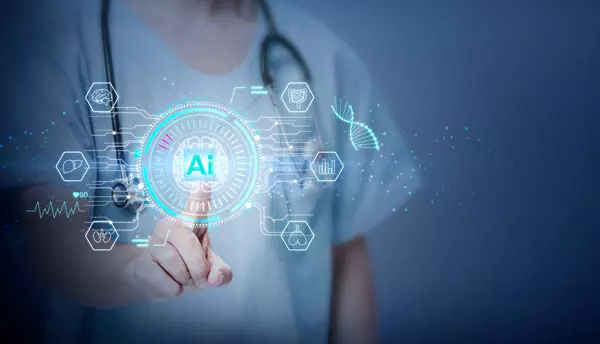
의료현장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의료AI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속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공·생활데이터와의 통합, 비정형 데이터의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AI의 신뢰도와 성능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처에 따르면 의료AI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관리·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의료AI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21세기 치료법’ 등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은 ‘AI법’ 등으로 의료용 빅데이터의 2차 활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AI 법제들은 서로 충돌하고 있다. 현행 의료AI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에 있어 절차와 기준이 상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조사처는 포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예컨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외부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면서도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의 범위, 적정 통제방식과 기술적 조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산업기술진흥법’, ‘암 관리법’ 등에서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의 절차가 서로 상충한다.
조사처는 ‘데이터 통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별법으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개방 ▲데이터 간 통합의 제도화 ▲개인정보보호의 내실화라는 3가지 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사처의 의견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의료AI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속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공·생활데이터와의 통합, 비정형 데이터의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AI의 신뢰도와 성능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처에 따르면 의료AI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관리·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의료AI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21세기 치료법’ 등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은 ‘AI법’ 등으로 의료용 빅데이터의 2차 활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AI 법제들은 서로 충돌하고 있다. 현행 의료AI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에 있어 절차와 기준이 상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조사처는 포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예컨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외부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면서도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의 범위, 적정 통제방식과 기술적 조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산업기술진흥법’, ‘암 관리법’ 등에서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의 절차가 서로 상충한다.
조사처는 ‘데이터 통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별법으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개방 ▲데이터 간 통합의 제도화 ▲개인정보보호의 내실화라는 3가지 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사처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