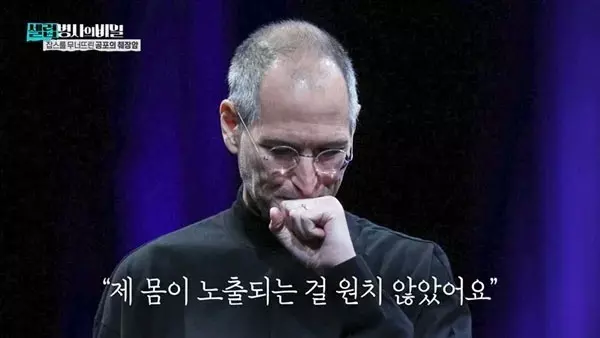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를 모은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은 스티브 잡스의 건강에 대해 다뤘다. 여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웹소설 작가 이낙준이 출연했다. 그는 “잡스는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을 당시 이미 췌장암 투병 중이었다”며 “정확히 말하면 고형암인 췌장암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종양인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이었다”고 말했다.
이 질환은 신경계와 내분비 조직이 서로 얽혀 생기는 종양으로, 췌장암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치료 예후가 좋은 편이다. 실제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5년 생존율은 약 96%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잡스는 요로결석 치료 중 우연히 종양을 발견했음에도, 수술 대신 채소·과일 위주의 극단적 식이요법과 단식, 장세척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잡스는 진단 9개월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간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 그는 아들 리드의 졸업식만은 꼭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2011년 10월 5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이낙준 교수는 “단식을 하면 가벼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지방과 근육이 분해되며 생긴 케톤이 포도당처럼 작용해 나타나는 착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 환자는 절대 단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체력이 떨어져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권우일·장진영·김홍범 교수 연구팀은 최근 신경내분비학(Neuroendocrinology)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918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재발 위험요인과 치료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14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술 후 5년 무병생존율은 86.5%로 확인됐다. 재발 위험요인은 ▲수술 부위에 남은 암세포 ▲WHO 분류체계상 고등급 ▲림프절 전이로 나타났다. 특히 종양 크기 자체는 재발의 독립적 요인이 아니었지만, 임상병리학적 특성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2cm 이하 종양은 2cm 이상보다 등급이 낮고 림프절 전이율도 적었으며, 5년 무병생존율이 더 높았다. 다만 1~2cm 크기에서도 약 10%의 림프절 전이와 3%의 재발이 확인돼, 단순 경과관찰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은 스티브 잡스의 건강에 대해 다뤘다. 여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웹소설 작가 이낙준이 출연했다. 그는 “잡스는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을 당시 이미 췌장암 투병 중이었다”며 “정확히 말하면 고형암인 췌장암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종양인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이었다”고 말했다.
이 질환은 신경계와 내분비 조직이 서로 얽혀 생기는 종양으로, 췌장암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치료 예후가 좋은 편이다. 실제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5년 생존율은 약 96%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잡스는 요로결석 치료 중 우연히 종양을 발견했음에도, 수술 대신 채소·과일 위주의 극단적 식이요법과 단식, 장세척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잡스는 진단 9개월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간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 그는 아들 리드의 졸업식만은 꼭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2011년 10월 5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이낙준 교수는 “단식을 하면 가벼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지방과 근육이 분해되며 생긴 케톤이 포도당처럼 작용해 나타나는 착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 환자는 절대 단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체력이 떨어져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권우일·장진영·김홍범 교수 연구팀은 최근 신경내분비학(Neuroendocrinology)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918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재발 위험요인과 치료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14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술 후 5년 무병생존율은 86.5%로 확인됐다. 재발 위험요인은 ▲수술 부위에 남은 암세포 ▲WHO 분류체계상 고등급 ▲림프절 전이로 나타났다. 특히 종양 크기 자체는 재발의 독립적 요인이 아니었지만, 임상병리학적 특성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2cm 이하 종양은 2cm 이상보다 등급이 낮고 림프절 전이율도 적었으며, 5년 무병생존율이 더 높았다. 다만 1~2cm 크기에서도 약 10%의 림프절 전이와 3%의 재발이 확인돼, 단순 경과관찰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