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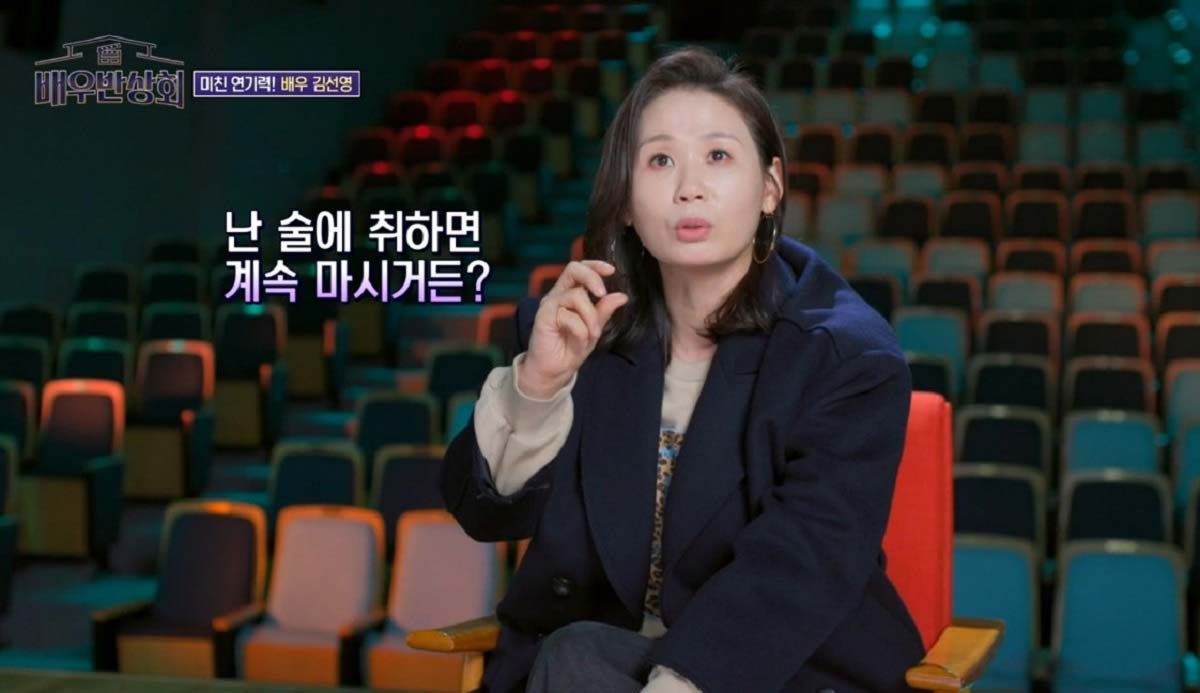
배우 김선영(47)이 막걸리를 마신 후 숙취로 고생한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 23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배우반상회’에 출연한 김선영은 메이크업을 받으며 숙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김선영은 “내가 예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그다음 날 술이 안 깨서 하느님한테 기도했다”며 “‘이번 술만 깨게 해주시면 다시는 술 안 마실게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막걸리가 유독 숙취가 심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막걸리는 불순물이 많은 발효주기 때문이다. 위스키나 소주와 같은 증류주는 끓인 후 수증기만 모아 만들어 불순물이 없다. 그러나 막걸리는 따로 어떤 물질도 버리거나 거르는 과정이 없다. 알코올 발효를 하는 미생물이 쌀 등 여러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한 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등 여러 물질을 만들고, 그대로 술 안에 남게 된다. 이때 탄닌이나 페놀, 메탄올 등과 같은 불순물도 남게 된다. 특히 메탄올은 몸속 산화효소에 의해 포름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이 미주신경과 교감신경을 자극해 숙취를 발생하게 한다.
게다가 막걸리엔 숙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들어 있다. 막걸리 속 미생물이 전분을 분해해 알코올로 만든 후, 알코올을 또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하곤 해서다. 보통의 술은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면서 숙취를 일으킨다. 그러나 막걸리를 마시면 술 속에 이미 들어 있던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막걸리 속 알코올이 몸속에서 분해돼 생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더해지면서 숙취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발효주답게 막걸리는 유산균이 많아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변비, 설사 등을 예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을 없애 면역력 강화를 돕는다. 다만 술인 만큼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 게 좋다. 하루에 2잔 (450mL) 이하로 마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 또 막걸리를 마신 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선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가 들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다. 뭄바이 화학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 라임, 치즈, 토마토, 오이 등에 ALDH가 많이 들어 있다.
지난 23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배우반상회’에 출연한 김선영은 메이크업을 받으며 숙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김선영은 “내가 예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그다음 날 술이 안 깨서 하느님한테 기도했다”며 “‘이번 술만 깨게 해주시면 다시는 술 안 마실게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막걸리가 유독 숙취가 심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막걸리는 불순물이 많은 발효주기 때문이다. 위스키나 소주와 같은 증류주는 끓인 후 수증기만 모아 만들어 불순물이 없다. 그러나 막걸리는 따로 어떤 물질도 버리거나 거르는 과정이 없다. 알코올 발효를 하는 미생물이 쌀 등 여러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한 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등 여러 물질을 만들고, 그대로 술 안에 남게 된다. 이때 탄닌이나 페놀, 메탄올 등과 같은 불순물도 남게 된다. 특히 메탄올은 몸속 산화효소에 의해 포름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이 미주신경과 교감신경을 자극해 숙취를 발생하게 한다.
게다가 막걸리엔 숙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들어 있다. 막걸리 속 미생물이 전분을 분해해 알코올로 만든 후, 알코올을 또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하곤 해서다. 보통의 술은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면서 숙취를 일으킨다. 그러나 막걸리를 마시면 술 속에 이미 들어 있던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막걸리 속 알코올이 몸속에서 분해돼 생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더해지면서 숙취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발효주답게 막걸리는 유산균이 많아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변비, 설사 등을 예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을 없애 면역력 강화를 돕는다. 다만 술인 만큼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 게 좋다. 하루에 2잔 (450mL) 이하로 마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 또 막걸리를 마신 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선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가 들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다. 뭄바이 화학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 라임, 치즈, 토마토, 오이 등에 ALDH가 많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