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승인·해외 판매 쉬워… 매혈 합법화로 수급도 용이
GC녹십자 등 글로벌 제약사, 앞다퉈 美에 혈액원 오픈
'피'는 약이다.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되는데, 혈구의 적혈구·혈소판은 빈혈·백혈병 환자 치료 등에 쓰인다. 수혈용으로 쓰고 남은 혈장은 제약사에 공급돼 혈액제제로 생산된다. 간 질환자를 위한 '알부민', 혈액암 환자를 위한 '면역글로불린', 혈우병 환자를 위한 '혈액응고인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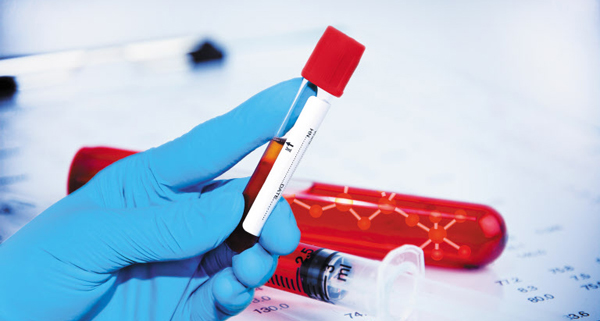
그런데 사람의 피는 다 같은 피 아닐까? 일단 유럽인들의 피는 광우병 관련 우려가 있어 기피 대상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혈액의 국가별 자급자족을 권하고 있는데, 국민적 특이성으로 인해 특정 국가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로 퍼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동남아나 남미 사람들의 혈액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관리 수준이 낮아 수입을 꺼린다. 말라리아 유행지역도 피한다.
그럼 미국인들의 피를 '선호'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없고, 관리 수준이 높기 때문?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인 피로 만든 혈액제제는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쉽게 허가·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도 용이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매혈이 합법화돼 있다. 샤이어·CSL·옥타파마 등 글로벌 혈액제제 제조사들이 앞다퉈 미국에 수십개 혈액원을 세우는 이유다. 미국인은 매혈하면 회당 30달러(한화 3만5000원) 정도를 받는다. 일주일에 2회 매혈이 가능하며, 한 번 채혈 때 양은 800㎖로 한국(320~400㎖)의 2배가량이다.
세계 혈액제제 시장은 약 25조원 규모.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2조원이 북미 시장이다. 국내 혈액제제 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인데, GC녹십자의 압도적 우위 속에 SK플라즈마가 뒤를 쫓고 있다. GC녹십자의 혈장처리능력은 세계 8위권이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두 곳의 혈액원을 미국에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