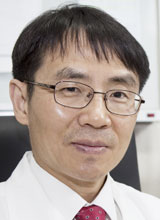
비슷한 현상은 항암제나 연명치료에서도 나타난다. 임종이 임박한 암환자에게 항암제를 쓰면 치료 효과는 없고 고통만 가중되기 때문에 마지막 2~3개월 동안은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암으로 사망한 한국인 375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 전 1개월 시점에 항암제를 투약받은 사람은 31%에 달한다. 미국에선 이 비율이 9%에 불과하다. 반면, 말기 암환자에게 정작 필요한 마약성진통제 사용량은 1인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런 실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명 이상의 말기 환자가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으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중환자실에서 맞는다. 인공호흡기는 심한 호흡곤란이 있는 급성 질환자를 회생시키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에게 달면 고통받으며 임종하는 기간만 연장시킨다.
말기 암환자가 생의 마지막 기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낼지는 환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의식이 없어지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적절한 통증 조절을 받으면서 또렷한 의식 상태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인공호흡기 및 기타 연명치료는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환자가 숨질 때까지 중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연명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당장은 전신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족은 환자가 일시적이지만 회복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자가 그 과정에서 받는 추가적인 고통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사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환자 상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돼 있다면 연명의료를 시행할지에 대해서 환자 본인 및 보호자가 의료진과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